디스토피아 소설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읽었던 ‘The giver(기억 전달자)’ 이후로, 다른 디스토피안 소설들(Farenheit 451, 1984, Brave new world, Animal farm,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The road, Handmaid’s tale, Divergent 시리즈)을 읽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서 읽기 카페에서 같이 북클럽으로 1984와 Brave new world(멋진 신세계), Animal farm(동물농장)을 같이 읽으셨던 분이 북클럽을 열면서 같이 읽자고 하셔서, 읽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유명한,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Utopia(유토피아)였습니다. 고전이라서 고전하게 될 것 같아서, 피하고 싶었으나 어린 시절 세로로 돼 있는 전집에서 잠깐 읽었을 때 뭔가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책이라서, 2016년에 북클럽에 참여해서 읽었던 책입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분명히 유토피아에서 5년이나 살다온 라파엘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야기를 들은 피터 가일즈의 고증을 받아서 썼다고 하면서 그 신빙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읽기로는 전반적으로 그리고 절대로 탁상공론이며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물론, 토마스 모어가 갖은 시대적 한계가 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았겠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의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이야기에서든, 적은 시간 노동을 통해서도 넉넉한 삶에 대한 이야기든, 모든 것이 다 실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공경받는 모습도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뭔가 답답해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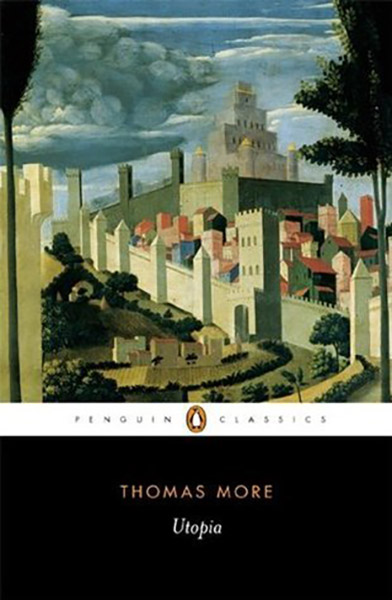
하여튼, 이 책을 처음에는 내용이 안 들어와서 머리에 쥐가 났지만, 내용이 조금 들어오면서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생각했던 유토피아가, ‘The giver(기억전달자)’나 ‘Divergent(다이버전트)’ 시리즈에 나오던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The giver(기억전달자)’나 ‘Divergent(다이버전트)’ 시리즈에 나오는 디스토피안 세계가 토마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 세계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니까요. 행복하니, 어떤 문제를 제기할 리도 만무하고요. 그렇지만, 제 눈에는 이상하게도 그가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의 세상이, 디스토피안 소설에서 본 세상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The giver(기억전달자)’나 ‘Divergent(다이버전트)’ 시리즈에서는, 사람들이 계급별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사회 전체가 관리되는 시스템이고, 개인의 개성이 무시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다양한 사회인 것 같지만, 옷도 다 비슷하게 입고 직업은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급 사회가 이어진다는 느낌도 듭니다. 하여튼, 저는 어딘가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요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현 인류에게는 실현될 경우에는 디스토피아가 돼 버리는 공포의 대상이 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그가 그리는 이상향이 뭔가 즐겁고 신나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거나, 모두가 행복하고 나도 그 안에서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찬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가부장적인 그가 그리는 나라라서 그런지, 나한테는 무척 불리하고 암울한 세계에 놓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의 책을 읽는 것은 디스토피안 소설을 읽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꼰대들의 말씀들을 듣는 것과 같게도 느껴졌구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지는 잘 모르겠고, 그와 친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중간부터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점은 계속 인정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가 말년에 처형되고 말았다는 것에서는 진정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읽다가 정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제 나름대로의 소박한 결론은, 누군가의 유토피아가 타인에게는 공포의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로, 싫다는데 내 주장 들이대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 해 봅니다.
세계 최대 서평 사이트인 굿리즈(Goodreads)에 따르면, 1516년에 그것도 1월 1일에 초판 발간된 이 책은 별 점이 5개 만점에 3개 반을 받았습니다. 7만명이 넘게 읽고 평점을 매겼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리뷰를 달았다고 합니다. 오래된 고전이니만치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이라서, 이 책의 무료 이북은 아마존 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쿠텐베르크 프로젝트 홈페이지(Project Gutenberg : https:http://www.gutenberg.org/) 에서 무료 이북을 구하실 수도 있고, 리브리 복스( Librivox : http://librivox.org) 에서 무료 오디오북도 쉽게 얻으실 수 있어서 원서로 읽으실 때는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굿리즈에서 나오는 책의 페이지수는 120쪽에서 215쪽 정도입니다. 실제로 읽어봐도 두께 자체는 별로 두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책이 원래 라틴어로 된 책이라면서요. 그러니, 영어책도 원서가 아니라 번역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좀 쉬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료 이북으로 봐서 그런가, 번역본인 주제에 너무 어렵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실제 책 길이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챕터 개수는 9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라파엘이라는 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의 마을, 행정, 삶의 매너 그런 식으로 주제를 하나씩 잡아서 한 챕터씩 서술되는 형식입니다. 챕터 길이는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 번 이상 읽어서 간신히 의미 파악하고 체계를 조금이나마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절대로 초급이나 중급은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고급입니다. 고전은 고전하면서 읽는다지만, 지금까지 읽었던 고전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어려워서인 것도 있고, 책 자체가 쉽게 쓰이지 않아서 그렇지 싶습니다.

고전이니만치 한글 번역본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읽을 것 같은 책으로 번역본 표지를 찾았습니다.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그냥 제 눈에는 번역본으로 읽는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266쪽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에서도 역대급인 것을 찾았습니다. 라틴어 원전을 번역했다는데, 500쪽이 넘습니다. 과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고전(Classic)'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평] We by Yevgeny Zamyatin (76) | 2023.11.15 |
|---|---|
| [서평] Frankenstein by Mary Wollstonecraft Shelley (230) | 2023.11.11 |
| [서평]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by F. Scott Fitzgerald (98) | 2023.10.05 |
| [서평] The Great Gatsby by F. Scott Fitzgerald (110) | 2023.10.02 |
| [서평] Farenheit 451 by Ray Bradbury (156) | 2023.09.25 |




댓글